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수능이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봅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작품은 2022 수능완성에 실려있는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란 소설입니다.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 자주 봤던 작품이죠?
액자식 구성인데다가 상징적 소재가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꽤 난해하게 느껴졌을 법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샘과 같이 공부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 오늘도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나'라는 서술자가 '박준'이라는 인물이 "왜 미친 것일까"를 추리해나가는 과정을 외부 이야기로 하면서, '박준'이 쓴 소설이나 인터뷰 기사와 같은, 그에 대한 힌트들을 내부 이야기로 삼고 있는 작품입니다.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핵심 소재는 손전등의 불빛인 '전짓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짓불은 '박준'이 가진 트라우마이자 좁은 의미로는 정체를 감춘 채 사상을 검증하는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개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감시 체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전짓불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변한 것이 바로 소설의 제목인 '소문의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대답을 요구하거나 사상을 검증하지는 않지만, 사람들 속에 정체를 감춘 채로 자신들(권력이나 사회)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소문을 조정하는 존재들이 바로 '소문의 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시절이라는 것을 연결지어 생각해본다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럼 줄거리와 핵심적인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1분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영상을 먼저 보고 본 영상을 본다면 더 폭넓게 이해가 되실거예요!
[판옵티콘(panorticon)]에 대한 설명
이청준 [소문의 벽] 해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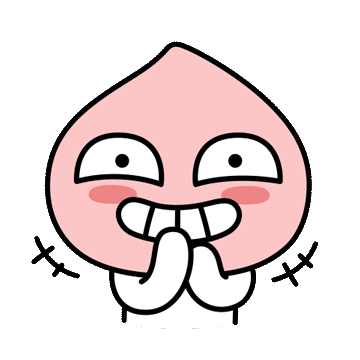
그럼 핵심 정리를 통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갈래 : 중편 소설, 액자 소설
성격 : 실존적, 상징적
배경 : 1960년~1970년대 (시간적) / 어느 도시 (공간적)
시점 : 1인칭 시점 (외부 이야기) / 전지적 작가 시점 (내부 이야기)
주제 : 작가의 정직한 자기 진술을 용인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저항
특징
-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구성된 액자식 구성이자, 추리 형태를 보임
- '나'와 '안 형', '나'와 '김 박사', '나'와 '박준', '박준'과 '김 박사'가 서로 갈등 구조를 보임
- '나'는 '박준'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박준'이 지은 소설들과 인터뷰 기사는 각각 주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만 보기>
위에서 시점을 1인칭 관찰자나 주인공 시점이 아닌, 1인칭 시점이라고 해 놓은 것은 '나'를 주인공으로 보느냐, 관찰자로 보느냐에 따라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견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외부 이야기에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안 형'이나 '김 박사' 등과 갈등 관계를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단지 '박준'을 관찰하는 역할을 넘어선 '작가의 대변인'으로서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 전체 소설의 주인공은 '박준'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나'는 '박준'이 미친 사람처럼 구는 이유를 추리하고 관찰해나가는 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부 이야기 속의 소설과 인터뷰를 가장 중심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쪽에서는 '나'가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것이지요.
둘다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완성>에도 문제와 해설에 모두 '1인칭 서술자'라고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학교교육이나 참고서에서는 보편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대비할 때는 EBS의 논점에 맞춰서 '1인칭 서술자'로 공부해주시면 되겠죠?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2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소설 작품은 모두 함께 봤는데요.
샘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어렵지 않았죠? ㅎㅎ
다음 시간에는, 수능 시험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꿀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샘이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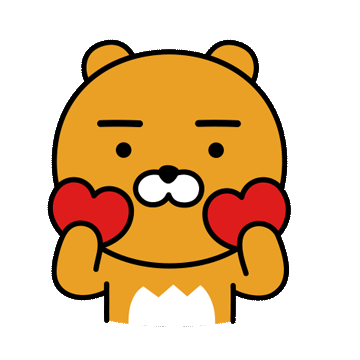
'문학 한예지 > EBS 수능완성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2 수완 오정희 [전갈]: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숨겨진 욕망🦂 (0) | 2021.09.28 |
|---|---|
| 2022 수완 이제하 [초식]: 육식 세상에 저항하려는 몸부림 (0) | 2021.09.08 |
| 2022 수완 황순원 [곡예사]: 피에로의 슬픔을 같이 공감해볼까요? 🤡 (0) | 2021.08.24 |
| 2022 수완 박완서 [환각의 나비]: 수능 D-100. 너희를 위해 찾아왔다! (0) | 2021.08.10 |
| 2022 수완 현진건 [고향]: 수능 완성 완전 정복은 예지샘과 함께 (0) | 2021.07.27 |
![[예지력] 예지 있는 국어 생활](https://tistory4.daumcdn.net/tistory/4833325/skinSetting/a3236f531acd4cf0b9fd5e606d93ced8)




댓글